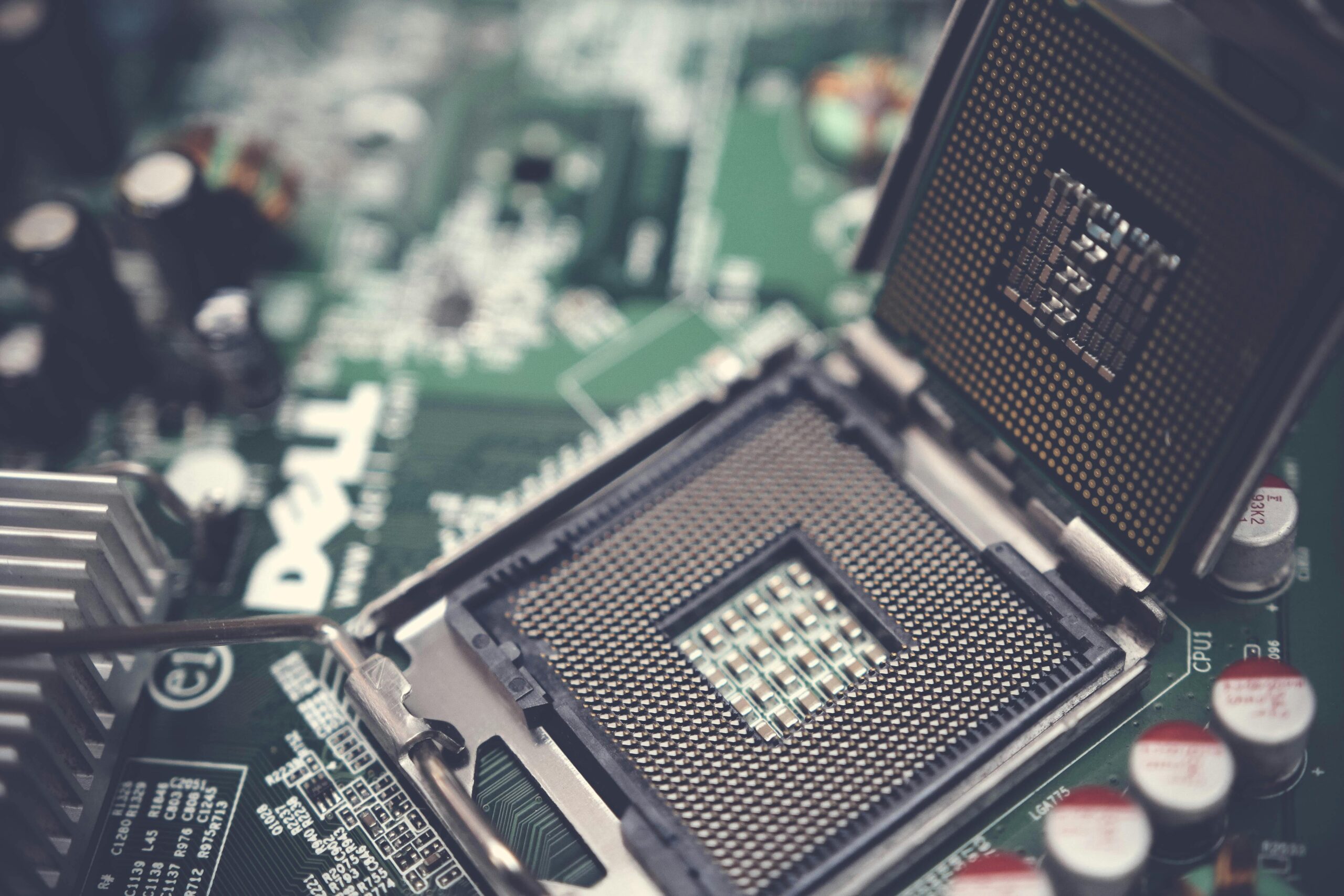
미국·중국 반도체 패권 경쟁의 최신 동향과 글로벌 공급망 영향
- Gary Scott
- 0
- Posted on
서론
반도체 산업은 현대 전자기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. 특히 인공지능, 자율주행, 5G 통신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기술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, 이러한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. 이 글에서는 양국의 주요 정책과 업계 동향,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.
1. 미국의 반도체 정책과 지원 전략
1.1. CHIPS and Science Act (2022년 제정)
- 미국 의회는 2022년 “CHIPS and Science Act”를 통과시켜 반도체 연구·개발(R&D)과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예산 약 520억 달러를 승인했다.
- 우수한 인재 유치, 첨단 제조 시설 건설,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“반도체 주권”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표다.
- 마이크론, 인텔 등 미국 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 지원금을 통해 신규 팹(Manufacturing Fab) 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다.
1.2. 수출 규제와 블랙리스트 제재
-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억제하기 위해 핵심 제조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.
-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이 생산하는 극자외선(EUV) 노광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했으며,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(CAD tool)도 중국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한했다.
- 이로 인해 중국 내 반도체 제조 공정은 기술 전환과 장비 확보 측면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.
2. 중국의 반도체 자립 노력과 전략
2.1.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
-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국익에 직결된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, 매년 수십조 위안을 투자하고 있다.
- 주요 프로젝트로는 선전(Shenzhen), 허페이(Hefei), 시안(Xi’an) 등의 첨단 패키징·조립·테스트(Test & Assembly) 클러스터 구축이 있다.
- TSMC, SMIC(중신궈지) 등 중국 내 파운드리 업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14nm 이하 공정 기술 확보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.
2.2. 기술 자립을 위한 장비·소프트웨어 개발
- 중국은 외국산 고급 장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. 대표 기업으로는 SMEE가 극자외선(EUV) 전공정을 향한 전진을 시도 중이다.
- 반도체 설계 툴 분야에서는 윈텍(Wintek), 챠이신(Ceicun) 등이 자체적으로 설계 자동화(EDA)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며, 장기적으로 수입 소프트웨어 의존을 줄이려 한다.
3. 양국 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
3.1. 공급망 다각화 가속화
-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대응으로 인해 전통적인 “원스톱 공급망” 구축이 어려워졌다. 주요 반도체 제조 공정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,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 다각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.
- 대만의 TSMC, 한국의 삼성,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은 서로 다른 지역에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.
3.2. 초격차 기술 경쟁 격화
- 미국과 중국 모두 차세대 반도체 기술(3nm 이하, 2nm, 나아가 양자 컴퓨팅용 반도체)에 공을 들이고 있다.
- 이로 인해 기존 파운드리 업계 외에도 물리학·화학·소재 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며, 글로벌 R&D 협력 방식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.
3.3. 국제 무역 패권 경쟁 심화
- 반도체는 국가 안보, 산업 자립, 기술 주권과 직결되어 있다. 미국은 우방국과의 기술 동맹(반도체 컨소시엄)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, 중국은 일대일로(一带一路) 정책을 통해 개도국에 반도체 협력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 중이다.
-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을 둘러싼 무역 정책(관세, 투자 제한, 수출 통제)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
4. 전망 및 시사점
4.1. 장기적 기술 자립 경로 탐색
-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인 극자외선(EUV) 노광장비와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.
- 미국은 공급 안정성을 위해 미·유럽·일본 연대, 그리고 대만·한국과의 협력 심화가 필요하다.
4.2. 협력과 경쟁의 공존 모색
- 완전한 탈동조(Decoupling)는 현실적으로 어렵다.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은 수십 개국의 장비·소재·설계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.
- 대신 동맹국 간 신뢰 기반의 기술 협력, 공급망 회복탄력성(Resilience) 확보, 그리고 공정·소재 다변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.
4.3.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회
- 대형 파운드리 외에도 팹리스(Fabless) 스타트업, 반도체 장비 기업, 소재 기업 등 중소 규모 업체들이 특정 분야(특수 소재, AI 가속기, 센서 반도체 등)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선보인다면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을 보완할 수 있다.
결론
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은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. 두 국가의 정책과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, 기술 주권 확보 경쟁을 가속화한다. 그러나 완전한 분리보다는 동맹국 간의 협력과 기술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야 공급망 안정성과 첨단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다.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이 다변화되고, 각국이 자국 및 동맹국 내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 질서 역시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.
